|
GMO에 대한 비과학적 인식을 깨고 GM 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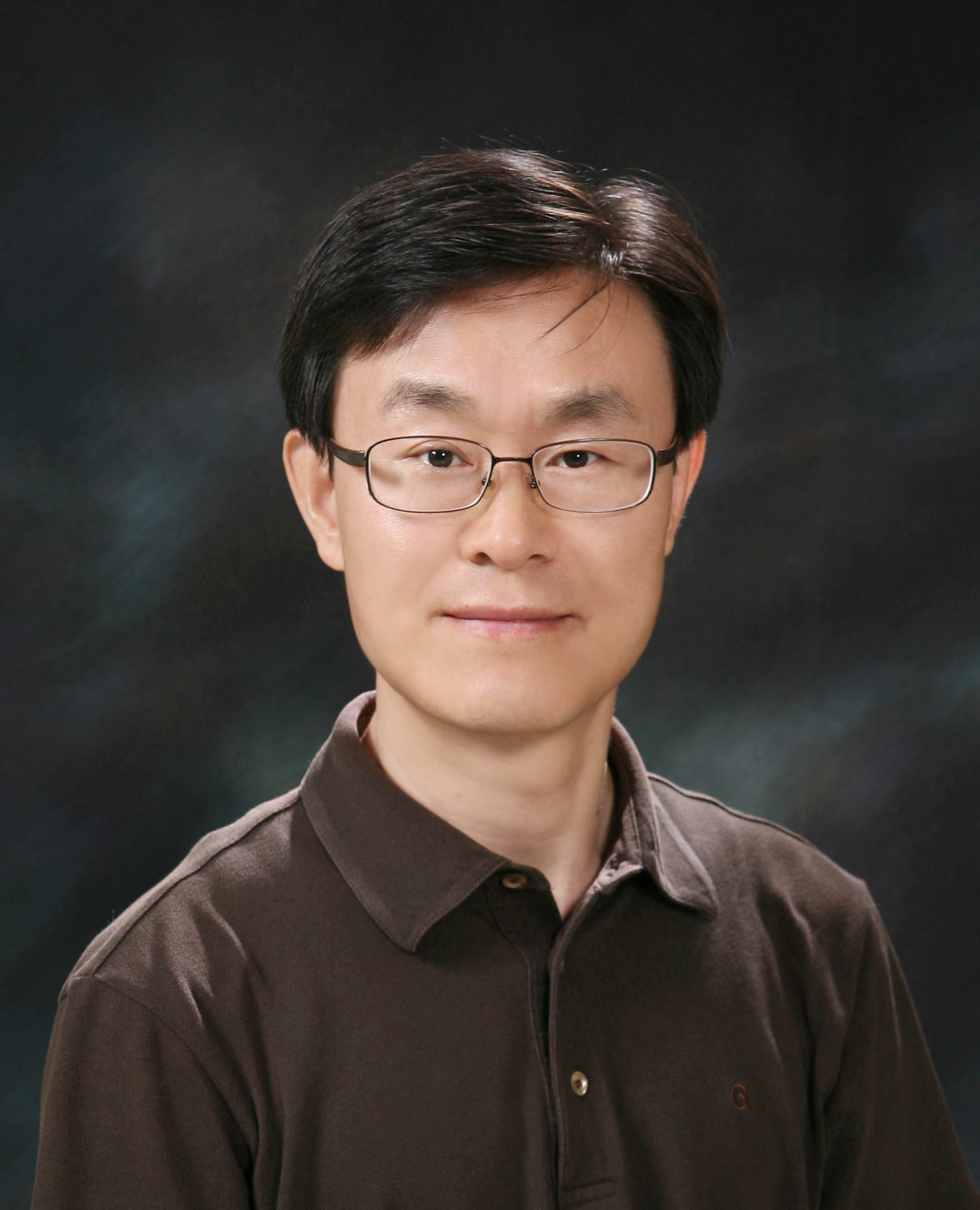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교수 조형택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과 입법/언론 담당자들의 GMO에 대한 인식은 비과학적 논리와 괴담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된다. 간혹 GMO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환경에서 발견되면 국회에서는 추상같이 환경부를 추궁하고, 뉴스 매체들의 GMO에 대한 보도와 그에 딸린 댓글들에서는 GMO와 GMO 식품은 피해야 하는 것이 상식일 뿐 아니라 저주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취급된다. 이렇게 만연한 그릇된 인식의 혁파 없이 GM 기술의 활성화는 요원함이 분명하다. 과학을 벗어난 GMO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반 대중들과 특히 입법 담당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이 이러한 노력을 개별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효과도 미약할 것이다. 연구기관들에서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런 홍보 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런 홍보 활동뿐 아니라 GMO 규제의 실무를 제공하는 GMO 전문가들/생명과학자들의 GMO 평가에 대한 전향적 재인식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소위 알 수 없는 GMO의 유해성이라는 프레임 속에 조그마한 가능성에도 양보하는 과학자의 순수한 양심은 한편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수행하는 과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신이 아닌 다음에야 세상에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안전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는가? 미국학술원(National Academies)은 재조합 DNA 기술이 처음 개발되었던 1970년대에 스스로 발견한 엄청난 기술에 놀라 (그리고 과학적 양심에 따라) GMO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20년간 본격적으로 GMO를 소비해온 뒤인 2016년 미국학술원은 900편이 넘는 논문들을 분석하여 580쪽에 이르는 GM 작물의 안전성에 대한 방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미국학술원, 2016. GMO 영향 평가 보고서, https://www.nap.edu/catalog/23395/genetically-engineered-crops-experiences-and-prospects). 보고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공학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기업 관련 연구자들이 수행한 연구결과들은 배제하였다. 이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GM 작물의 재배와 이용이 환경, 건강에 유해하다는 어떤 인과성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형질전환체 선별을 위한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 Bt 독소(살충 유전자),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 등의 유해성 없음에 대한 결론이 포함되어 있다. 오히려 GMO 사용은 환경, 건강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들을 우리 전문가들이 우선 인식하고 대중에게 적극 홍보 할 필요가 있다. GMO 안전성의 핵심 이슈가 되는 외래 유전자의 유해성 여부는 전통 교배 육종법과 비교하여 그 안전성의 이론적 배경을 확고히 인식해야 한다. 교배를 통한 전통 육종법은 수천 개의 외래 유전자 도입 또는 유전체 전체의 변이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전성 평가 대상이 되지 않지만, 단지 한 개 또는 몇 개의 유전자가 도입된 GMO의 경우 매우 엄격한 안전성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과학을 떠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GMO 반대론자들의 일관된 주장일 뿐 아니라 생명과학 전문가 중에도 주장하는 것이 새로운 유전자가 도입된 GMO의 알 수 없는 유해성이다. 생물학적으로 서로 다른 種인 포멜로(Citrus maxima)와 밀감(Citrus reticulata) 사이의 교배를 통해 두 생물학적 종의 유전체 전체가 뒤섞인 전통 육종 GMO <오렌지>의 알 수 없는 유해성을 우리는 우려하는가? 인류가 농업을 시작한 1만 년이 넘는 역사이래 개선해온 작물들치고 이런 육종교배와 선택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두 새로운 유전자가 도입된 GMO들인 것이다. 이런 전통 육종에 의한 GMO들은 우리나라만 매년 500종이 넘게 등록되지만(국립종자원 2019년 통계: http://www.seed.go.kr/seed/268/subview.do), 어느 것 하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는다.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GM 작물 중에는 타 식물(작물) 종의 유전자를 도입할 때가 있는데 특히 이런 경우는 그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전통육종 품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유전자편집 산물에 대한 입장이 정립되지 않은 듯한데 유럽에서처럼 이를 GMO와 동일시하는 실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돌연변이 유도라는 기술의 원리상 유전자편집의 결과물은 유해성/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전통 돌연변이 육종기술의 결과물과 하등의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하고 불필요한 돌연변이 발생이 압도적으로 낮다는 과학적 사실을 인지하고,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유전자편집 작물의 경우는 전통 돌연변이 육종 작물에 버금가는 작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GM 기술의 상용화는 주로 남북미대륙을 중심으로 주도되어 왔으나 현재 유럽을 제외하고는 점차 확산할 기세에 있다(ISAAA Brief 55: Global Status of Commercialized Biotech/GM Crops: 2019; https://www.isaaa.org/resources/publications/briefs/55/default.asp). 아직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이러한 시점에서 GM 기술의 기반이 우수한 우리나라가 규제를 완화하고 그 잇점을 선점하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추론컨대 지금 GM 기술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장차 상당한 경쟁력 상실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급격한 작물 생육환경의 변화는 전지구적 식량안보에 다층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를 환경재앙에 대비하기 위해, 당장의 현실적인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생명공학 작물들을 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 기후재난이 발생하게 되는 위급상황 아래에서 이렇게 준비한 생명공학 작물들은 우리 국민과 인류를 구원할 방주로 환영받을 것이다.
| 
